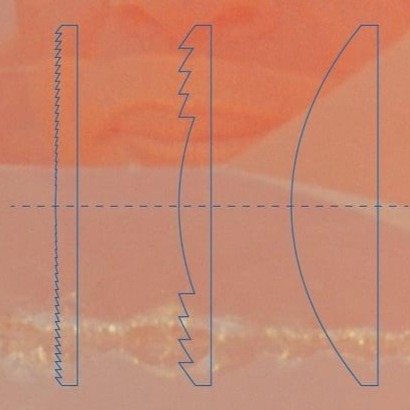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미디어 이론
- 파스퀴넬리
- 미디어이론
- 리사나카무라
- 우편 체계
- 기송관
- 네트워크권력
- 쉽록
- 인종화
- 웬디 희경 전
- 비릴리오
- 제이슨 파먼
- 프랑스이론
- 로젠블랫
- 인프라구조
- 네트워크시각화
- 알렉산더 갤러웨이
- 마테오 파스퀴넬리
- 푸코
- 물질성
- 피셔 숄즈
- 신자유주의
- 미디어연구
- 밈
- 디지털미디어
- 오릿 핼펀
- 젠더화
- 베르나르 디오니시우스 게이건
- 냉전과학
- 정보미학
- Today
- Total
INTERFACING
[번역] 밈적 욕망: 포스트휴머니즘, 정치적 정동 그리고 증식에 대한 20개의 테제 (도미닉 페트만) 본문
| 이는 『포스트-밈: 생산의 밈들을 장악하기 Post Memes: Seizing the Memes of Production』에 실린 Dominic Pettman의 글「Memetic Desire: Twenty Theses on Posthumanism, Political Affect, and Proliferation」를 번역한 것이다. 오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1. 인간은 언제나 이미 포스트휴먼이다.
인간은 인간의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에 의존하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은 하나의 역사적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범주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인간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포스트휴먼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능가하기 위해서 항상 도구와 인공보철(prostheses)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원초적 기술성(originary technicity)”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나르 스티글러 Bernard Stiegler, 데이빗 윌스 David Wills 등등을 보라.)
2. 정치는 (포스트)휴먼 문화의 뼈 속에 구축된다.
예를 들어,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Space Odyssey> 도입부의 한 원숭이가 다른 뼈를 두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뼈 혹은 초기 인간 조상이 그림, 장신구, 주문의 도구로 사용했던 뼈들을 보라.
3. 기술과 예술은 테크네(technē)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유래한다.
테크네는 “예술, 기교, 제작, 빚기, 생산, 현시”를 포함하는 고대 그리스어다.
4. 기술과 정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유래한다.
사이버네틱스는 특히 조종이나 항해의 은유적 행위(kybernēsis)를 통한 “거버넌스(국가경영 혹은 공공경영)”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kybernētikē에서 유래한다.
5. 이와 같이, 예술과 정치는 테크닉(technics)으로 연결되고 매개된다.
테크닉은 기술 자체 내부에 거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계적인) 광범위한 혹은 심원한 논리이다.
6. 다른 기술적 인공물들은 현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캠페인에 인간을 참여시킨다.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이 그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그들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미디어와 기술을 선호하는 것처럼.
7. 우리는 “미디어(매체)”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를 제작하기도 하는 여러 겹의 도구와 아상블라주(배치)라고 여긴다.
8. 각각의 새로운 기술적 대상 혹은 배열은 이전의 미적 질료의 퇴적물에서 떨어져서 새로운 미적 정향(orientation)을 가능하게 하고 권장하며, 이 새로운 미적 정향은 차례차례로 새로운 정동을 양성한다. 이는 증식(proliferation)의 새로운 벡터의 방식으로 발생한다.
9. 우리는 이런 증식의 새로운 벡터들의 자발적인 정비 직원을 “예술가/기술가(artists)”라고 부른다.
10. 포스트휴먼 맥락에서 증식은 대체로 전염과 열광의 사례인데, 증식은 우리로 하여금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가 “형식의 내용”(즉, 매체가 메시지를 형성하고 선-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하게 한다. 이런 전염은 기술적 매개의 다른 정도에서 일어나며, 열광의 매개체는 종종 그 자체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11. 아날로그 증식은 디지털 증식에 의해 즉시 증폭되고, 가속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부하기가 힘든 루머를 생각해보라. 지난 세기에 루머는 구두로 전달되었겠지만, 아마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해서 더 강해지기도 했다. 오늘날 이런 루머는 인터넷을 통한 배포됨이라는 미덕에 의해 새로운 결, 시간성, 스케일(규모), 영향력을 취한다.
12. 증식의 일부 형식들은 주목 경제 내부의 가시성에 의존한다. (실시간 트렌드, 해시태그, 바이럴 비디오, 정치적 운동 등)
13. 증식의 다른 형식들은 사적, 공적 혹은 정치적 주목의 결여에 의존한다. (컴퓨터 바이러스, 비트코인, 오염, 무기 등)
14. 증식의 일부 형식들은 가시성과 비가시성, 전염과 탈커뮤니케이션(excommunication, 추방, 파문을 뜻한다-역자 추가) 양자의 복잡한 결합에 의존한다. (테러리즘, 극단주의, 국가 폭력 등)
15. 인터넷―특히 “소셜 미디어”라 소위 불리는―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미시/거시적인 열광을 교통시키는(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열광들을 취소시키는) 행성적인 증식실, 혹은 전지구적인 밈 기계로 여겨질 수 있다.
밈은 문화 내부에서 혹은 문화를 가로질러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가는 생각, 행동 혹은 스타일이다.
하나의 밈은 미디어를 통해 한 마음으로부터 다른 마음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하나의 밈은 생각, 상징, 혹은 관습을 실어 나르는 “문화적 구성단위(cultural unit)”이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밈을 문화적 유전자와 유사한 무엇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밈은 텍스트를 동반하는 의도적으로 투박한 이미지를 묘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를 웃고, 느끼고, 그리고/혹은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바이러스 같이 퍼지면서 주로 소셜 미디어를 경유해 순환한다.
특히나 효과적이거나 인기를 얻은 하나의 밈은 “쩐다(dank)”고 묘사된다.
16. 예를 들어, “생명-옹호(pro-life, 낙태 반대주의를 말한다-역자 추가)”로 알려진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입장은 다른 사람들이 분개에 찬 고결함을 느끼도록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이미지 “증식(pro-liferation)”의 의도적인 양식을 사용한다. 분개에 찬 고결함이라는 정동은 스피노자가 “슬픈 정념”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이다. 이 정동은 차례로 여성의 신체, 개인의 자유, 의학 기술 등과 맺는 과잉결정된 생명정치적 관계를 부추긴다.

17. 때맞춰, 생명-옹호 입장의 약탈적인 전문 지지자들은 생명-옹호 프로파간다의 더 많은 지지자들의 독점적 증식을 도용하며, (어쩌면 적절하게도) 모든 정절(적절성, propriety)을 넘어서는 생명옹호 이데올로기적 지속발기증으로 이어진다.
18. 우리는 아마도 밈을 기업, 정치,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력한 신호 동력이 부여되는 새로운 민속 예술로 간주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19. 이와 같이, 우리는 밈적 욕망의 황금기에서 살고 있다.
“밈적 욕망(memetic desire)”은 “미메시스적 욕망(mimetic desire)”과 관계는 있지만 거리는 있다. 미메시스적 욕망은 이론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 의해 유명해졌다. (미메시스적 욕망은 모든 욕망의 기원을 욕망하는 주체에 외부적인 것으로 동일시한다. 미메시스적 욕망에 의해, 라이벌 혹은 롤 모델은 욕망에 불을 지피는데, 이는 욕망이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대상 이상으로 그러하다.)
밈적 욕망 역시 다른 곳에서부터 파생하는데, 이는 모방에서 태어나는 것이기보단 감염 혹은 전염에서 태어난다. 밈적 욕망은 기원적이고 본질적인 삼각 구조(욕망하는 자-욕망의 매개자-욕망되는 자)의 흔적을 함유하고 있지만, 밈적 욕망은 네트워크를 걸치면서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특정한 매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삼각 구조를 프랙탈화한다. 그러므로 주체는 확립된 이데올로기적 패턴의 유인원이라기보단, 반사체, 매개체 혹은 숙주이다. 이 주체를 통해서 밈적 통화들은 흘러다니거나 성장한다. 인간은 쉽게 영향에 휘둘리는 하나의 꼭두각시 인형이라기보다는 끈의 연장자인 것으로 드러난다. (혹은 더 낫다면, 연결된 선들을 인도하는 장력으로 말이다.)
말하자면, 전-인터넷 시기의 포스트휴먼이 타자가 욕망직하다고 이미 발견한 것을 욕망했던 곳에서(예를 들어, 돈키호테나 엠마 보바리 같은), 오늘날의 포스트휴먼은 실시간 트렌드 알고리즘과 추천시스템 엔진을 통해 무엇을 욕망할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욕망할지에 대해 듣기를 욕망한다(예를 들어, 시리, 에코 등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 중 누구든). 사실, 우리 자신은 이제 밈적 네트워크의 반(半)-유기적 노드로 기능한다.
20. 밈적 욕망의 황금기는 그러므로 압축된 정동의 슬프고 정념적인 “문화적 구성단위,” 즉 일반 지성의 남조류가 꽃을 피우고 떠다니는 반사적인 물웅덩이로 우리의 감정의 구조가 액체화되는 한 시대의 출현이다.
'번역 > 단막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번역에 대한 리스트 (1) | 2022.12.31 |
|---|---|
| [번역] 클라우드 제어, 혹은 매체로서의 네트워크 (셉 프랭클린) (2) | 2022.12.17 |
| [번역] 포스트-페페 선언문 (허성영) (2) | 2022.12.07 |
| [번역] 공간적 쇠약: 팔레스타인에서의 느린 삶과 감금 자본주의 (재스비어 K. 푸아) (3) | 2022.12.05 |
| [번역] 방향/지어진/응시: 지구에 대한 구글 어스의 내러티브와 응시의 사유화 (마리 하인리히) (7) | 202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