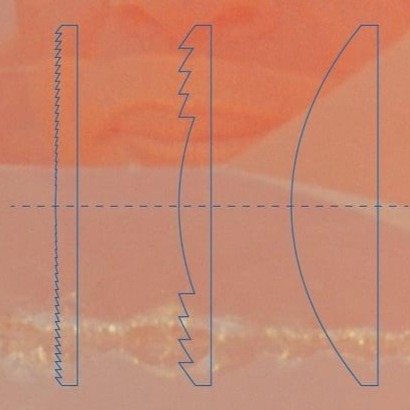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알렉산더 갤러웨이
- 정보미학
- 신자유주의
- 쉽록
- 프랑스이론
- 비릴리오
- 오릿 핼펀
- 인종화
- 로젠블랫
- 물질성
- 우편 체계
- 냉전과학
- 파스퀴넬리
- 젠더화
- 네트워크시각화
- 제이슨 파먼
- 리사나카무라
- 디지털미디어
- 네트워크권력
- 미디어연구
- 마테오 파스퀴넬리
- 푸코
- 웬디 희경 전
- 베르나르 디오니시우스 게이건
- 미디어이론
- 인프라구조
- 피셔 숄즈
- 기송관
- 미디어 이론
- 밈
- Today
- Total
INTERFACING
[번역] 기계 안의 비둘기: 행동주의와 사이버네틱스에서의 통제 개념(애나 텍세리아 핀토) 본문
| 이는 meson press에서 출간하고, 마테오 파스퀴넬리가 편집한 「마음의 골목들: 확장된 지능과 그 트라우마 Alleys of Your Mind: Augmented Intelligence and Its Traumas」에 실린 애나 텍세리아 핀토(Ana Teixeira Pinto)의 글, 'The Pigeon in the Machine: The Concept of Control in Behaviorism and Cybernetics'를 번역한 것이다. (아쉽게도 주석은 PC를 통해서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 |

존 B.왓슨(John B. Watson)이 1913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행동주의자가 보는 심리학”1이라는 취임 연설을 했을 때, 그는 심리학을 “행동의 예측과 통제에 이론적 목표”가 있는 분과로 소개했다. 조건 반사에 대한 이반 파블로프(Ivan Pavlov)의 연구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왓슨은 응용심리학을 위한 객관적인 과학의 지위를 주장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심리학을 확고하게 자연과학의 영역에 정박시키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실험적 방법론을 위해 사변을 포기해야만 했다
생명과학에서의 통제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질서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났다. 뚜렷한 비대칭성과 불균등한 발전에 의해 형성된 사회에서, 중산층의 삶의 방식은 불안정한 만큼이나 전도유망했고, 하향식 이동성이 규범이었다. 경제적 불안은 품행이라는 코드, 그리고 의학과 도덕관념으로부터 외삽된 새로이 발견된 위생 습관의 코드로 체계화되었다. 행동주의와 우생학 양자는 숙련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잠재적인 일탈들을 통제할 필요로부터 나왔다. 예를 들어, 왓슨은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위가 “자위하는 사람”을 낳는다고 확신했다(Buckley 1989, 165). 하지만 질서에 대한 고착은 생물학보다도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는 생명이 질서와 동의어라고 봤고, 엔트로피는 죽음 혹은 무질서의 척도라고 봤다.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 미국에서 등장한 모든 다른 분과 영역―분자 생물학부터 사이버네틱스까지―은 동일한 핵심 은유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거대한 인구통계 변동의 압력 하에, 가족, 계급, 그리고 교회와 같은 낡은 사회적 제도들은 침식되기 시작했다. 그에 뒤따른 권위의 위기는 “사회적 통제에 대한 새롭고도 지속적인 형식들을 설립하려는 계속된 노력”으로 이어졌다.(Buckley 1989, 114) 행동주의는 “외부에서의 강압(coercion from without)”이 “내부에서의 강압(coercion from within)”으로 쉽게 은폐될 수 있는 방법론을 옹호한 것이었다. 두 가지 형태의 제약은 나중에 결단력으로 재-개념화되고, 증가하는 젊은 전문직 계급과 자수성가한 구직자 계급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마케팅 되었다.(Buckley 1989, 113). “기계로서의 인간”이라는 왓슨의 직설적 정의는 사회적 통제에 헌신하는 자아라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위한 개념적 틀을 그려나가는 데에 중요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기계적 구조(mechanisms)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조직과 전자 회로 간의 유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계는 그들의 활력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기계는 복제가능하고 예측가능하며, 톱니바퀴 같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조합되고 재조합될 수 있다. 기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노예다. 그리고 노예상태(slavery)는 생산과정을 자동화하려는 모든 시도 뒤에 있는 정치적 무의식이다.
응용심리학의 과학적 영역은 부상하는 테크노크라시에 호소했는데, 왜냐하면 그것(테크노크라시-역자 추가)은 사회적 긴장들이 정치의 형식을 취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한 번에 조금씩의 단계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이동성을 관리해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Buckley 1989, 113). 왓슨이 노골적으로 말했듯, 행동주의는 엄격히 “비정치적이다.” 그것은 권위주의나 통제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제적인 심리학 검사는 “품행 일탈,” “감정적 혼돈,” “비표준적 성감,” 혹은 “무단결석”의 어떤 기미든 탐지할 것이고, “행동의 반사회적인 방법들”을 제거하는 재조건화의 과정을 보증할 것이었다(Buckley 1989, 152). 첫 번째 적색 공포(the first Red Scare)와 병행하여 발전했기 때문에, 행동주의는 과학적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 진지였다. 영국의 의회주의가 딱 프랑스 혁명을 모면하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미국 자유주의의 수사도 공산주의 전염의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었다.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명령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급과 함께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지위 상승을 이뤄내도록 추동했다.
개, 쥐, 그리고 사내 아이
행동주의는 그것을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남자,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와 불편한 관계를 맺었다. 왓슨의 취임 연설이 1916년에 출간된 후에, 조건화에 대한 실험 작업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반사라는 개념은 미국 교재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Ruiz et al. 2003). 파블로프는 미국에 오직 두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다. 1929년 두 번째 방문 때, 그는 예일대의 제9회 국제 심리학회와 하버드대의 제13회 국제 생리학회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그가 초청 승낙 편지에서 적기를,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저의 기여가 심리학자들한테 수용가능한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흥미롭게 여겨질지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의 기여는 순수하게 생리학적―고차신경체계의 기능들에 대한 생리학―이지 심리학적인 것은 아닙니다”(Pare 1990, 648). 행동주의가 열렬하게 “파블로프의 실험실로부터 부흥한” 실험적 방법과 기술적 어휘들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적 수입의 과정은 러시아의 이론적 관점의 수용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Ruiz et al. 2003). 조건화에 대한 파블로프의 기법은 채택됐지만, 이것이 신경 자극을 이해하는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서가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Ruiz et al. 2003). 미국 심리학은 본능적이거나 선천적인 반응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연구자들은 자극/반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 그리고 행동 패턴의 결과들에 집중했다. 미국 심리학에서의 파블로프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전통에서 이미 확립된 심리학의 바로 그 특성들의 결과이다. 파블로프의 작업은, 주로 객관성의 모델로서, 그리고 심리학을 자연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왓슨의 오래된 욕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 학습에 통합되었다”(Ruiz et al. 2003).

왓슨이 고등 포유류와 인간 사이의 심리학적 반응에 대한 파블로프의 비교 연구를 상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결코 그런 노선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파블로프로부터 빌린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린이들의 기질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쏟았다. 그의 ‘리틀 알버트 실험(Little Albert Experiment)’에서, 왓슨과 그의 조수 로잘리 레이너(Rosalie Rayner)는 생후 11개월 된 유아가 평소였다면 두려워할 성향이 없었던 자극을 두려워하도록 조건화하려고 시도했다. 리틀 알버트에게는 처음에 몇몇 털 달린 실험용 동물들이 주어졌으며, 그중엔 흰 쥐가 있었다. 그 동물과 관련해서 리틀 알버트가 사전(事前)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진 후, 왓슨과 레이너는 쥐의 현존과 (왓슨이 강철 막대에 망치를 부딪쳐서 끌어낸) 시끄럽고, 예상할 수 없는 소음을 연관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험들을 시작했다. 소음을 듣자마자, 아이는 명백한 불안의 신호들을 보여주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두 자극(쥐와 쨍그랑 하는 소리)이 쌍을 이루는 일련의 시험 이후에, 리틀 알버트에게는 다시 그 쥐 하나만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시기에서, 아이는 명백하게 동요하고 괴로워하는 듯 보였다. 쥐를 토끼와 작은 개로 대체하면서, 왓슨은 리틀 알버트가 그의 두려움을 모든 털 달린 동물들에게 일반화했음을 확실히 했다. 실험은 결코 성공적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왓슨은 심리학을 습득과 습관들의 배치에 대한 연구로서 정의내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왓슨의 실험의 뒤를 이어, 미국 심리학자들은 기능(skills)으로서의 학습의 모든 형식―“미로를 달리는 쥐”부터 “성격 패턴의 성장”까지―을 취급하기 시작했다(Mills 1998, 84). 행동주의 운동(movement)에서, 동물과 인간의 행동은 모두 반사, 자극-반응 연합, 그리고 그들에게 작용하는 강화 인자의 효과들이라는 용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었다. 왓슨의 발자취를 따라, 벌허스 프레더릭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그가 이름붙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특정한 외부 자극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고전적인(혹은 파블로프와 같은) 조건화가 단순하게 자극과 반응을 짝패로 놓는다면,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동물의 행동은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그 행동이 유발하는 피드백은 특정 행동의 재발을 강화하거나 억제한다. 스키너 상자(Skinner box)라고 불리게 될 하나의 공간을 이용해서, 스키너는 보상의 계획을 세우고 규칙들을 설립할 수 있었다.2 동물은 며칠 동안, 그리고 매시간 행동의 주어진 패턴이 안정화될 때까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조건화될 수 있었다.
행동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오직 실험실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특정 자극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밀즈가 쓰기를(1998, 124), “대조적으로, 실제 삶의 환경들에서는 사건의 강화를 식별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강화인자가 행동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그때그때 맞는 설명들을 제공하기도 힘들다.” 실험실 바깥에서는, 동일한 반응은 아주 다양한 선행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독 원인을 식별하는 것도 악명 높게 어렵다. 대체로, “누군가는 오직 그가 조작적 원칙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사전에 만들었을 때에만, 실험법칙으로서의 조작적 조건화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Mills 1998, 141).
놀랍지 않게도, 왓슨은 하퍼스 매거진에 실린 일련의 기사에서, 그리고 스키너는 1948년에 나온 자신의 소설 <왈든 투 Walden Two>에서, 둘 모두 행동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완전히 살을 덧댄 허구적 설명을 제출한다. 스키너가 선구자인 왓슨이 지니고 있는 싸늘한 여성혐오와 무심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유사성은 놀랍다. 두 저자에게, 범죄는 자유의 작용이다. 사회적 행동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병폐들―통제 불가능, 범죄, 가난, 전쟁,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화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요구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유토피아는 대의제와 마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크노크라시의 위계질서에 교육을 양도하는 데에 관여한다(Buckley 1989, 165).
위에서 언급했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 내에 강요가 부재하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계급 갈등에 대한 맑시즘의 모델을 따라 사회적 투쟁을 적대적인 것으로서 재현하는 대신에, 왓슨과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자들은 사회의 설계자와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 옹호된 자기-훈육과 효율성의 에토스를 반영한다. 버클리가 언급했듯(1989, 165), 행동주의 유토피아는 “효율성만을 숭배하고,” 암묵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도 무시해버리고, “질서와 무질서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저울 위에서 그들의 판단을 저울질한다.”
비둘기, 서보 메커니즘, 그리고 가미카제 조종사들
행동주의와 거의 마찬가지로, 사이버네틱스 또한 입력-출력(input-output) 분석에 근거를 두었다. (강화에 의해 선별된) 가능한 행위들의 목록이라는, 조작적 행동에 관한 스키너의 묘사는 위너의 정보 루프에 대한 묘사와 다르지 않았다. 행동주의는 사이버네틱스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에서 강화라고 알려진 재귀적(피드백)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게다가, 행동주의와 사이버네틱스는 종종 기묘한 친연성 이상의 것을 공유해왔다. 세계 2차 대전 동안,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와 스키너는 미국 군대를 위해 아주 유사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위너가 공학자 줄리안 비글로우(Julian Bigelow)와 함께 대공예측기(anti-aircraft predictor, AA-predictor)―적기의 궤도를 예측야만 하는 기계―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스키너는 비둘기-유도 미사일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비둘기(Project Pigeon, 스키너가 아무도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후에, 프로젝트 오르콘 Project Orcon―“ORganic CONtrol(유기적 통제)”―으로 이름이 나중에 변경되었다)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1944년 일본의 가미카제 공습은 이 프로젝트에 재개된 동력을 부여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심리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일본 병사들은 보통 이(lice)나 해충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지만, 가미카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해진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사이의 정체성을 대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기계적 구조(mechanism)는 인간의 기능을 빼앗는다. 본인 버전의 노예-병사들을 생산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화적 금지에 직면하여, 스키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간 가미카제의 만족할 만한 대체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로젝트 비둘기 팀은 비둘기가 과녁의 시각을 통해 타깃을 볼 때마다 부리로 쪼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소형 승강기에 묶어, 쪼아대는 동작이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도록 했다. 스크린의 중앙을 계속 부리로 쪼고 있는 한, 미사일은 직선으로 날아갈 것이고, 반대로 중심에서 벗어나 쪼고 있다면 스크린이 옆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때 미사일은 경로를 바꾸게 되고, 미사일의 비행 통제 장치와의 연결을 통해서 지정된 타깃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게 될 것이다. 스키너의 비둘기는 스트레스, 가속도, 압력, 온도차 하에서도 신뢰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도 스키너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가동 준비된 상태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스키너는 MIT 서보메커니즘 실험실(the MIT Servomechanisms Laboratory)에서 분석될 수 있는 양적 자료를 생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스키너는 서보-공학(servo-engineering)의 언어를 취할 것을 강요당한 것에 개탄했고, “신호”와 “정보” 같은 용어들의 사용을 경멸했다. 프로젝트 비둘기는 1944년 10월 8일에 취소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는데, 군대가 그것이 전술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너의 팀은 미분 해석기(differential analyzer)의 도움을 받아, 포병의 사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기(敵機, enemy plane)가 취할 수 있는 궤적의 네 가지 다른 유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다. 갤리슨(Galison)은 이렇게 쓴다, “여기에는 물리학적인 동시에 생리학적인 문제가 있었다. 대공포의 폭발 한가운데서 비행하는 조종사, 난기류, 전투기를 타깃으로 안내하려고 시도하는 탐조등을 훑어보는 행위”(1994). 전투 조건의 중압감 하에, 인간 행동은 반사 반응의 제한된 수로 축소되기 쉽다. 기계적인 것과 인간 행동의 패턴 간의 유사점들에 주석을 달면서, 위너는 조종사의 침공 기술이 서보메커니즘의 작동을 조절하는 동일한 피드백 원칙을 따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그가 더 보편적인 생리학 이론을 비약적으로 추론하게 될 아이디어였다.
위너의 발견이 그의 공학 연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위너의 예측기는 상당한 행동주의적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기체의 구조를 탐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유기체의 과거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유기체의 미래 행위를 예측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스티비츠와의 서신에서 인용, Galison 1994). 피드백에 대한 위너의 정의는 “과거의 수행에 비추어 미래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의 특성”이다(Wiener 1988, 33). 위너는 또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다루는) 행동주의를 동반하는 기능분석과, 모든 행동이 본질적으로 목표 지향적이고/이거나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채택했다. 파리를 노리는 개구리와 타깃을 찾는 미사일은 목적론의 메커니즘들이다. 양자 모두 행위의 경로를 재조정하기 위해 정보를 모은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위너는 결코 행동주의자들에게 어떤 공도 돌리지 않았다. 대신에 폄하성 비판만 그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1943년 대공예측기는 국방연구위원회(the National Defense Research Committee)가 더 성공적인 M9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포기되었다. 이 건 디렉터(M9)는 파킨슨(Parkinson), 러벨(Lovell), 블랙맨(Blackman), 보드(Bode), 섀넌(Shannon)이 벨 연구소(Bell Lab)에서 개발해 왔던 것이다. 프로젝트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대공예측기가 군사(軍史, military history)의 쓰레기통에 처박혀 끝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 전략적 실패는, 위너가 인간-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합방정식으로 묘사하는 데 결정적이지는 않았던 생리학과 만났다. 그는 이 생리학을 수학적 모델과 수사적 장치로 개발하는 데에로 나아갔다.
회로 그리고 소비에트
신뢰할 수 있는 대공예측기가 아니라, AA 프로젝트에서 등장한 것은 “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위너의 재-개념화였다. 그는 정보를 과학적 개념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던 참이었다.3 (이전에 모호한 의미를 가졌던 이 개념) 정보는 시계열의 수학적 분석에 의해 요구된 통계적 특성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보가 수학적 개체로 정의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요컨대, 다음의 것이 사이버네틱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준다. 개념적 추상으로서의 피드백 처리. 하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정보 체계로 모델링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사이버네틱스는 또한 “(모든 뒤따르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항상 달성하기 힘든 상태로 남는 본질을 가진 강력한 형이상학”을 수반한다(Mindell, Segal and Gerovitch 2003, 67). 누군가는 심지어 사이버네틱스가 과학적 영역을 강력한 훈고학적 모델로 융합시킨 것이라고, 위너가 개인적 카리스마를 동반해 이를 지속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위너는 “사이버네틱스의 패러다임의 더 큰 함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의 우주적 중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선지자”였다(Hayles 1999, 7). 통계 역학(statistical mechanics)의 가장 중요한 관념을 비전문가에게 설명하면서, 위너는 직설적이면서도 극적인 유비를 소묘했다. 엔트로피는 “조직된 것을 분해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자연의 경향”이다. 그러므로, “생물의 안정적 상태는 죽음을 맞이할 예정이다”(Wiener 1961, 58). 그는 나중에 넌지시 말하는데, 추상 예술과 아방가르드 예술은 “점증하는 엔트로피의 나이아가라 폭포”다(Wiener 1988, 134).
사이버네틱스에 주요한 개념이 될 “엔트로피”는 처음에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에 의해 생물학에 적용됐다. 생물학과 물리학이라는 분과 영역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슈뢰딩거는 역설에 직면했다고 느꼈다. 생물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명백히 열역학의 제2법칙과 모순됐다. 열역학의 제2법칙은 에너지가 습득되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어떤 폐쇄계의 경향이든 시간에 따라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러므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물은 “필연적인 열죽음(thermal death)을 방지”할 수 있는가(Gerovitch 2002,65)? 슈뢰딩거는 증가하는 엔트로피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질서정연함(orderliness)”을 추출하는 열역학 체계로 유기체를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퍼즐을 풀었다. 이런 생각은 기이한 결론을 수반했다. 생물과 비생물 간의 근본적 분할은 유기체와 기계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슈뢰딩거에게,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다(Gerovitch 2002, 65).
생명과학 영역으로의 슈뢰딩거의 습격은 생물학자들에게 묵살됐고, 그의 이론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슈뢰딩거가 생물학 개념들을 물리학 어휘로 번역한 것은 그가 결정적인 유비를 과학 담론에 도입하고, 그 유비가 분자생물학 영역의 토대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코드에 새겨진 메시지로서의 염색체”라는 유비 말이다(Gerovitch 2002, 67).
코드 은유는 명백히 전쟁에 대한 준비와 군사 메시지를 부호화(encoding)하고 해독(decoding)하는 그들의 체계로부터 비롯되었다. 암호학자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은 또한 모든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기 위해 코드 은유를 추론했고, 슈뢰딩거와 비슷하게 그는 더 넓은 의미에서 불확실성의 척도로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했다. 슈뢰딩거가 물리학과 생물학 사이에서 소묘한 연속성이 거의 전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위너는 정보가 엔트로피의 반대라고 말하며 나중에는 메시지를 조직화의 형식으로서 묘사했다.
새로운 영역의 인식론적 연관성에 대한 위너의 관찰에 의해 구체화되어, 열역학 체계 연구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생물학, 신경과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과학, 생태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으로 퍼져나갔다. 1943년과 1954년 사이에, “사이버네틱스: 생물학과 사회 체계에서의 순환인과와 피드백 메커니즘(Cybernetics: Circular Causal, and Feedback Mechanisms in Biological and Social Systems)”이라는 제목 하에, 10회의 컨퍼런스가 조시아 메이시 주니어(Josiah Macy Jr)의 후원하에 메이시 재단(the Macy Foundation)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공헌한 학자들은 경제적 과정, 정신적 과정, 그리고 사회적 현상, 미적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와 통제에 대한 보편 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했다. 예를 들어, 현대 미술은 그 자체를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을 축소시키는 운용상 폐쇄적인 체계로 묘사되었다(Landgraf 2009, 179–204). (인간과 기계의 유비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이론을 공식화하려는 열망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행동주의는 인지주의로 알려지게 될 사이버네틱스의 압박에 마침내 동화되었다.
1950년대 초기에, 인간에 대한 존재론은 W. 로스 애쉬비(W. Ross Ashby)와 클로드 섀넌의 정보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래밍의 기능성과 동일시되었다. 분자 생물학과 진화 생물학은 유전 정보를 본질적 코드로 취급했다. 거기서 육체는 운반체일 뿐이었다. 인지과학과 신경생물학은 (뇌가 컴퓨터 하드웨어와 유사하다는 가정, 그리고 마음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작동하는) 형식적 상징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으로 의식을 묘사했다. 1950년대에, 노버트 위너는 인간을 전보로 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시사했다(Wiener 1988, 103). 1980년대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는 것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윈도우 상에서 실행(run)되고 혹은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다고 논의했다. SF(Science fiction)는 정보 코드로서의 불멸의 삶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테픈 울프람(Stephen Wolfram)은 심지어 현실이 우주의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의식은 “이용자의 환상,” 즉 인터페이스다.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조직과 전자 회로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둘러싼 논쟁은 또한 더 어두운 인간-기계 환상(좀비, 살아있는 인형, 로봇, 세뇌, 최면술)을 낳았다. 애니미즘은 행위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는 생물에서 무생물로의 목적의 이전을 수반하는 질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한 의식은,” 위너가 말하길, “우리의 행동을 돕거나 우리의 행동에 저항하는 자급자족 메커니즘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다. 자기 안정화하는 저항력과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비행기는 마치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요컨대 그렘린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 그렘린은, “서보메커니즘의 적은, 인간 생리학 더 나아가 인간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한 원형이 된다(Galison 1994).
평화를 동적평형상태(a state of dynamic equilibrium)[계의 내부가 미시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사이버네틱스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로부터 벗어나 수평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유효한 도구임이 증명됐다. 막 싹트기 시작한 반문화의 많은 구성원들은 자발적 조직과 조화로운 질서라는 사이버네틱스의 약속에 끌렸다. 하지만 이 질서는 이미 자유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묘사에서 가동 중이었다. 조절 장치―특히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증기 기관에 조속기를 병합한 이후의―는 정치적 수사와 연관됐다. 이 정치적 수사는 영국 자유주의의 여명 이래로 줄곧 “동적 평형,” “견제와 균형,” “자기 조절”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말했다(Mayr 1986, 139–40). 유사하게, 유기체와 환경 간의 피드백 루프의 개념은 이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와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이론에 존재했으며, 아까도 말했듯 자유시장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정의―사회와 문화를 괄호치는 빈 서판―는 또한 스키너 상자 실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놀랍지 않게도, 과학에 의해 수행되는 추상화는 물질적으로 구체적인 효과이다. 질서정연한 삶의 소규모 거주지가 점점 포위되고 있다는4, 혼란스럽고 더 나빠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관념은 공산주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산주의 물결(the Red Tide)을 멈추려는 노력과 공명했다. 운용 연구(operations research)와 게임이론과 함께, 핵미사일의 궤도 계산, 원거리 조기 경보(the Distance Early Warning Line), 그리고 억지 이론(deterrence theory)의 발전은 다가오는 위협을 예측하는 데에 전념했다. 하지만 예측은 또한 역사를 배제하면서 과거를 미래에 재기입하는 폭력의 행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처음에 시작됐던 전쟁은 “사회적 자유의 전면 유보를 수반했고,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거대한 통제를 낳았다”(Buckley 1989, 114).
마침내, 사이버네틱스는 신자유주의의 과학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이 대단원의 막은 반복적인 자유 경제의 광범위한 문화적 융합을 인간 통치의 최종 형식으로 내세웠던 1980년대 후반의 개념인 “역사의 종말”이었다.5 1997년 <와이어드 Wired>지는 “장기 호황 (The Long Boom)”이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었는데, 이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우리는 번영, 자유, 그리고 전세계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의 25년에 직면해 있다. 당신은 이것에 불만이 있는가?” “장기 호황”에서 주장하기를, 구소련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이데올로기적 적대로 방해받지 않는 세계는 끝없이 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번영과 위축되지 않는 성장을 목격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이 기사의 주장은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런 시장에 집착하는 낙관주의 브랜드는 90년대의 사고방식을 형성했다. 또한 이는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Californian Ideology)―“아메리칸 드림의 중심에 있는 모순,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만 몇몇 개인이 번영할 수 있는 그 모순을 무시하는 취약한 유토피아”(Barbrook and Cameron 1996)―라고 알려지게 될 것을 낳았다. 사회의 체계나 정신의 체계와는 다르게, 열역학 체계는 변증법적 긴장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열역학 체계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열역학 체계는 잔여물―일종의 쓰레기―을 축적할 뿐이다. 북한이나 베트콩의 호전적인 신체들,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빈곤한 신체들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해진 채로, 사이버네틱스는 포스트휴먼의 비물질성을 포용하게 된다.
(사이버네틱스가 대체하게 될) 변증법적 유물론은 정치적 형식들이 역사의 고차적 형식으로 연속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피드백은 변증법이 아니다.6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변증법을 모든 운동의 가장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정의했으며, 변증법을 사유에 대한 삼항 법칙―양에서 질로의 변형에 대한 법, 반대항들의 투쟁과 합에 대한 법, 부정의 부정에 대한 법―과 결부시켰다. 피드백과 변증법은 운동을 비슷하게 재현하지만, 사이버네틱스가 통합 모델이라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적대적 모델이다. 피드백이 영속적인 반복만 알고 바깥이나 모순을 알지 못한다면, 변증법은 근본적인 긴장이나 해결되지 못한 적대를 암시한다. 요컨대,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은 코뮤니즘의 가능성이 없는 변증법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잡음이라는 배경에 반하여, 역사 그 자체는 “미국의 권력에 의해 포위되고 밀봉된, 사유화된 공간” 주위를 회전하는 끝없는 반복 루프가 되었다(Edwards 1997, 8).
참고문헌
| -Barbrook, Richard, and Andy Cameron. 1996. “The Californian Ideology.” Science as Culture 6 (1): 44–72. -Buckley, Kerry W. 1989. Mechanical Man: John Broadus Watson and the Beginnings of Behaviorism. New York: Guilford Press. -Edwards, Paul N. 1997. The Closed World: Computer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n Cold War America. Cambridge, MA: MIT Press. -Galison, Peter. 1994. “The Ontology of the Enemy: Norbert Wiener and the Cybernetic Vison.” Critical Inquiry 21 (1): 228–66. --Gerovitch, Slava. 2002. From Newspeak to Cyberspeak: A History of Soviet Cybernetics. Cambridge, MA: MIT Press. -Hayles, N. Katherine. 1999.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dgraf, Edgar. 2009. “Improvisation: Form and Event: A Spencer-Brownian Calculation.” In Emergence and Embodiment: New Essays on Second-Order Systems Theory, edited by Bruce Clarke and Mark B. Hansen, 179–204.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Mayr, Otto. 1986. Authority Liberty and Automatic Machinery in Early Modern Europe. Baltimore, 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ikulak, Maxim W. 1965. “Cybernetics and Marxism-Leninism.” In Slavic Review 24 (3): 450–65. -Mills, John A. 1998. Control: A History of Behavioral Psychology. New York: NYU Press. -Mindell, David, Jérôme Segal, and Slava Gerovitch. 2003. “Cybernetics and Inform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he Soviet Union.” In Science and Ideology: A Comparative History, edited by Mark Walker, 66–96. London: Routledge. -Pare, W. P. 1990. “Pavlov as a Psychophysiological Scientist.” Brain Research Bulletin 24: 643–49. -Ruiz, Gabriel, Natividad Sanchez, and Luis Gonzalo de la Casa. 2003. “Pavlov in America: A Heterodox Approach to the Study of his Influenc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6 (2): 99–111. -Thoreau, Henry David. 1980. Walden and Other Writings. New York: Bantam. 6 -Wiener, Norbert. (1954) 1988.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Reprint of the revised and updated edition of 1954 (original 1950). Cambridge, MA: Da Capo Press. -Wiener, Norbert. 1961.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Cambridge, MA: MIT Press. |
- 이것은 나중에 “행동주의 선언”으로 알려지게 될 일련의 강연 중 첫 번째였다. [본문으로]
- 원래의 스키너 상자에는 레버와 먹이 상자가 있었는데, 배고픈 쥐는 레버를 누를 법을 배움으로써 먹이 상자에 전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본문으로]
- 1994년 갤리슨이 쓰길, 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위너의 새로운 용법은 MIT의 사무엘 H.칼드웰에게 보낸 1940년 11월의 편지에서 등장했다. [본문으로]
- 바로 냉전으로부터 온 수사 내에서, 위너는 우주를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공간으로 묘사하는데, 이 우주에서 생명의 작은 섬들은 모든 곤란함에 맞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조직을 증대시킨다(Wiener 1961). [본문으로]
- “역사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보수적인 정치 과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1992년에 나온 그의 책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문으로]
- 놀랍지 않게도, 사이버네틱스는 요제프 스탈린(Joseph Stalin) 하에서 잠시 불법화되었는데, 그는 사이버네틱스가 자연, 과학, 기계적 체계를 동일시함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것을 부르주아의 유사과학으로 비난했다(Mikulak 1965). [본문으로]
'번역 > 단막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번역] 밈적 욕망: 포스트휴머니즘, 정치적 정동 그리고 증식에 대한 20개의 테제 (도미닉 페트만) (5) | 2022.12.08 |
|---|---|
| [번역] 포스트-페페 선언문 (허성영) (2) | 2022.12.07 |
| [번역] 공간적 쇠약: 팔레스타인에서의 느린 삶과 감금 자본주의 (재스비어 K. 푸아) (2) | 2022.12.05 |
| [번역] 방향/지어진/응시: 지구에 대한 구글 어스의 내러티브와 응시의 사유화 (마리 하인리히) (7) | 2022.12.03 |
| [번역] 터미네이터 VS 아바타 (마크 피셔) (7) | 2022.07.04 |